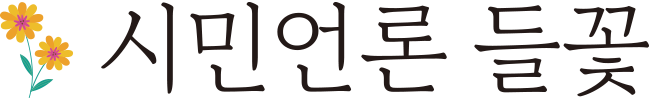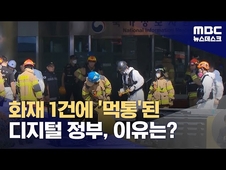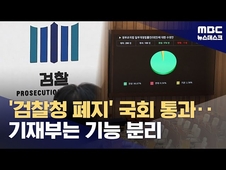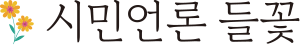26일, 검찰청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인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개청한 검찰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된다. 기소는 공소청에서 담당하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한다.
그간 검찰은 ‘정의의 수호자’라는 이름으로 기소를 독점하면서 국민 위에 군림했다. 선택적 수사와 기소,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소 남용, 사건 조작은 이미 여러 차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대표적인 사례는 한명숙 전 총리 기소, 조국 사태,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등이다. 사건을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별건 수사를 벌였으며, 증인을 회유했다. 관련 증언을 했던 인물들이 당시 검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인한 진술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반대로 자신과 보수 권력의 죄를 감추기에 급급했다. 대표적인 예가 17대 대선을 2주 앞두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고, 분명한 동영상이 있음에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특수강간 사건에 무혐의 처리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출장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청 폐지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책임 있는 수사·기소 체계 구축이다.
영국은 수사·기소 분리의 모범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과거 경찰이 가졌던 권한 남용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다. 영국 검찰은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율(60%대)은 한국(50%대)과 큰 차이가 없다.
미국도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되어 있으며, 기소는 지방 검사가 담당하고 시민 배심이 감시하는 형태다.
독일은 검사와 경찰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법원이 수사 과정을 통제하는 구조다.
이처럼 대부분의 선진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감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야 비로소 선진국처럼 제대로 된 수사 권력 감시 시작을 할수 있게 된 것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